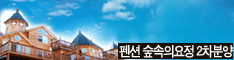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탐방] 교종(敎宗)의 수사찰(首寺刹), 남양주 운악산 봉선사(雲岳山 奉先寺)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 ▲ 봉선사 는 평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역사는 깊지만 유명 선사 가 별로 거치지 않았고 사찰유물도 남아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20131101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榛接邑 富坪里), 운악산(雲岳山)에 남쪽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969년 고려의 탄문(坦文)이 창건하여 운악사(雲岳寺)라 하고, 1469년(예종 1)에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貞熹王后) 가 세조(世祖)의 능을 보호하기 위해 89칸으로 중창하고 봉선사(奉先寺)라 하여 광릉(光陵)의 원찰(願刹)로 삼음. 1550년(명종 5) 문정왕후 수렴청정 시 선교양종(禪敎兩宗)이 부활될 때 교종의 본사가 되었다. 교종(敎宗)의 수사찰(首寺刹)로 여기서 승과시(僧科試)를 치르기도 하고, 전국 승려와 신도에 대한 교학(敎學)진흥의 중추적 기관 역할을 담당했다.
사찰의 특징은 교종(敎宗) 정진도량이어서 그런지, 임진란과 6.25때 소실되어서 그런지 유명하다는 스님이 거친 흔적이 거의 없고 절의 위상만큼 보물이 될만한 사찰유물-석탑이나 부도탑, 탑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 화재로 소실됐던 조선 숙종 어람본 봉선사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는 작년 실학박물관에서 복원해 봉선사에 기증했다.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이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불교와 학문적인 유교는 근본이 다르다. 충효의 덕목을 중시하는 유학이 부처의 종교와 왜 그렇게 대립했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감정적인 종교가 이성적인 학문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도 결국 왕실은 불교와 깊은 연관을 가졌다.
무학대사와 연관된 이성계 때부터 세조의 정희왕후, 명종의 모 문정왕후 도 마찬가지고 명성황후도 많은 사찰에 공을 들였었다. 현대에 와서 기독교계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산 문수사 를 자주 찾은 것이나 육영수 여사가 북한산 도선사 중창에 관여한 사실이 그렇다.
봉선사는 평지 길옆에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다. 분위기도 절이라기보다는 넓은 정원을 가진 '고택'을 방문한듯하다. 입구의 연꽃연못을 거쳐 경내에 진입하면 바위들에 앙증맞게(?) 새겨진 마애불 들을 여럿 볼 수 있다. 춘원 이광수도 잠시 머문 곳이라는데, 왕실의 원찰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소박하다.
문화재로는 보물 제397호로 지정된 남양주봉선사대종(奉先寺大鐘, 동종銅鐘) 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남양주봉선사괘불(南楊州奉先寺掛佛 = 비로자나삼신불화) 등이 있다. (龍)
※ 절 = 사, 찰, 사찰 : 수사찰(首寺刹) = 수찰사(首刹寺) = 수찰(首刹) = 수사(首寺). 1551년(명종 6) 문정왕후(文貞王后)가 봉은사를 선종수찰(禪宗首刹)로, 봉선사(奉先寺)는 교종갑찰(敎宗甲刹)로 하는 승과(僧科)를 부활하여 불교재흥정책을 폈다. (자료)
 |
| ⓒ서울포스트 |
 |
| ▲ 매우 웅장한 일주문 ⓒ서울포스트 |
 |
| ▲ 보운당대종사, 운허스님의 부도탑 등과 함께 공덕을 기리는 탑비 ⓒ서울포스트 |
 |
| ▲ 보운당(報雲堂)대종사 부도탑 ⓒ서울포스트 |
 |
| ▲ 춘원 이광수도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서울포스트 |
 |
| ▲ 승과원(승과평지,승과평터) ⓒ서울포스트 |
 |
| ▲ 이 사찰에는 작은 바위에 소규모로 새겨진 마애불 이 몇 점 된다. 아직 문화재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포스트 |
 |
| ▲ 'ㄷ'자 형대의 당간지주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 보물 제397호 봉선사대종 과 신축중인 법고 와 범종루 ⓒ서울포스트 |
 |
| ▲ 우리나라 최초 한글현판 '큰법당'은 1970년 운허스님이 중건하고 손수 쓴 글씨체. 그 앞 부처님 사리 1과가 봉안된 5층탑 (봉선사 오층석탑)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 수령 500여년 느티나무와 어울어진 사찰 진입로 ⓒ서울포스트 |
 |
| ▲ 현존 사찰로는 보기 드물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본당 ⓒ서울포스트 |
 |
| ▲ 사찰앞 연지(蓮池 연꽃연못)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이하 봉선사 검색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969년(광종 20)에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이 창건하여 운악사(雲岳寺)라고 하였다. 그 뒤 조선 세종 때에 이전의 7종을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할 때 이 절을 혁파하였다가, 1469년(예종 1)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가 세조를 추모하여 능침을 보호하기 위해 89칸의 규모로 중창한 뒤 봉선사(奉先寺)라고 하였다.
당시 봉선사의 현판은 예종이 직접 썼다고 하며, 현재 보물 제397호로 지정되어 있는 봉선사대종을 같은 해에 주조하였다고 한다. 1551년(명종 6)에 이 절은 선교양종 중 교종의 수사찰(首寺刹)로 지정되어 전국의 승려 및 신도에 대한 교학진흥의 중추적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전소, 이듬해인 1593년에 주지 낭혜(朗慧)가 중창하였다.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으로 다시 소실된 것을 1637년에 주지 계민(戒敏)이 중창하였으며, 1749년(영조 25)에는 재점(再霑)이 중수하였다.
1790년(정조 14)에는 나라에서 전국사찰을 관할하기 위한 5규정소(五糾正所)를 설치할 때 이 절은 함경도 일원의 사찰을 관장하였다. 1848년(헌종 14)에는 화주 성암(誠庵)과 월성(月城)이 중수하였고, 1902년에 도성 안의 원흥사(元興寺)를 수사찰인 대법산(大法山)으로 삼았을 때 이 절은 16개의 중법산(中法山)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경기도의 전 사찰을 관장하였다. 1911년에 사찰령이 반포되었을 때는 31본산의 하나가 되었고, 교종대본산으로 지정되어 교학진흥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또 1926년에는 주지 월초(月初)가 대웅전과 요사채를 중수하고 삼성각(三聖閣)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1951년 3월 6일에 법당 등 14동 150칸의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 뒤 1959년에 화엄(華嚴)이 범종각을 세운 데 이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운경(雲鏡)과 능허(凌虛)가 운하당(雲霞堂)을 세웠고, 1970년에는 주지 운허(耘虛)가 큰법당을 중건하고 1977년에는 월운(月雲)이 영각(靈閣)을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큰법당·삼성각·개건당(開建堂)·방적당(放跡堂)·운하당·범종각·청풍루(淸風樓)·요사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큰법당은 대웅전과 같은 법당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한글현판을 단 것이다. 법당 사방 벽에는 한글 ≪법화경≫과 한문 ≪법화경≫을 동판에 새겨놓아 이채롭다. 문화재로는 보물 제397호로 지정된 봉선사대종을 비롯하여 1903년에 그린 칠성탱화, 사찰 입구의 보운당부도(報雲堂浮屠) 등이 있다.
그리고 큰법당 앞에는 1975년에 운허가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 1과를 봉안한 5층탑이 있으며, 1981년에는 운허의 부도탑을 세웠다. 이 밖에도 사찰 안에는 ‘춘원 이광수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절 옆에 있는 광릉은 사적 제197호이며, 천연기념물 제197호인 크낙새가 주변 숲에 서식한다.
참고문헌
『조선불교통사』(이능화, 신문관, 1918)
『봉선사본말사략지(奉先寺本末寺略誌)』(봉선사, 1977)
『한국사찰전서』(권상로 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한국의 명산대찰』(국제불교도협의회, 1982)
『전통사찰총서』 5-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Ⅱ-(사찰문화연구원, 1995)
.............
▲ 운악산 봉선사(雲岳山 奉先寺) ⓒ서울포스트
▲ 매우 웅장한 일주문 ⓒ서울포스트
▲ 보운당대종사, 운허스님의 부도탑 등과 함께 공덕을 기리는 탑비 ⓒ서울포스트
▲ 보운당(報雲堂)대종사 부도탑 ⓒ서울포스트
▲ 춘원 이광수도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서울포스트
▲ 승과원(승과평지,승과평터) ⓒ서울포스트
▲ 이 사찰에는 작은 바위에 소규모로 새겨진 마애불 이 몇 점 된다. 아직 문화재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포스트
▲ 'ㄷ'자 형대의 당간지주 ⓒ서울포스트
▲ 보물 제397호 봉선사대종 과 신축중인 법고 와 범종루 ⓒ서울포스트
▲ 우리나라 최초 한글현판 '큰법당'은 1970년 운허스님이 중건하고 손수 쓴 글씨체. 그 앞 부처님 사리 1과가 봉안된 5층탑 (봉선사 오층석탑) ⓒ서울포스트
▲ 수령 500여년 느티나무와 어울어진 사찰 진입로 ⓒ서울포스트
▲ 현존 사찰로는 보기 드물게 신축과 증축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본당 ⓒ서울포스트
▲ 사찰앞 연지(蓮池 연꽃연못) ⓒ서울포스트
▲ ⓒ서울포스트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포털
다음 에 뉴스 송고)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포토] 제5회 서울 등(燈) 축제 '한성백제 천년의 꿈'](/paper/data/news/images/2013/11/1_S_1383447386.jpg)
![[포토] 종로의 "종북 척결!" vs 청계천의 "박근혜 책임!"](/paper/data/news/images/2013/11/1_S_1383443523.jpg)
![[탐방] 교종의 수사찰, 남양주 운악산 봉선사(奉先寺)](/paper/data/news/images/2013/11/1_S_1383325311.JPG)
![[탐방] 어느 가을날 의 광릉 국립수목원길](/paper/data/news/images/2013/11/1_S_1383325641.JPG)
![[포토] 도심 속 가을 - 강남 영동대로, 테헤란로](/paper/data/news/images/2013/10/1_S_138323630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