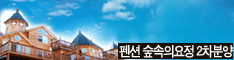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탐방]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용암사(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立像, 龍岩寺)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 ▲ 고려 때 조성되었다는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이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누구의 모습도 본 적이 없다. 기도하다 그대로 시간이 멈춘 - 그대로 굳은 듯한. ⓒ20150228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
| ⓒ서울포스트 |
파주 룡미리(龍尾里 용미리)는 광주산맥을 타고 들어 온 용이 한양에 머물렀는데 그 꼬리가 이 곳에 닿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고양 벽제(벽제관 碧蹄館: 중국사신이 한양을 오가며 유숙한 곳) 화장터와 가까이 있어 오래전부터 추모공원이 곳곳 조성돼 있다. 또 근처엔 한국전 후 미군군영을 상대로, 동두천과 함께 매춘 등의 서비스 로 성시를 이룬 용주골(龍珠谷? 龍州谷?)이 있다. 2006년에,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은 이곳을 한국의 매춘 심장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지만, 당시 성매매 단속으로 풍선효과를 타고 몰렸을 뿐, 최근엔 재개발로 인해 파리를 날리고 있다는 보도다. [※ '용주골'이라는 지명은 경기도에 몇 군데, 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에도 많다.]
성스러운 부처님을 알현하러 가는 길에 죽음과 성, 삶이라는 주제가 불쑥 튀어나온다. 다 일원론으로 볼 수밖엔 방법이 없다. 20년전 회사때 역시 동료들이랑 테니스도 치고 바람도 쐴 겸 보광사와 그 일대 유원지로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스쳤다.
버스 밖으로 고려 명장 윤관장군 묘소와 영정을 기리는 려충사(麗忠祀 여충사)가 보인다. 고려의 도읍 개경(개성)과 제2의 도읍 남경(한양,서울)의 중간에 임진강(림진강 臨津江: 나루터에 다다른다,는 뜻의 파주지역 강을 말함)을 끼고 있어 고려 역사가 유별난 파주. 이 주변으로는 공양왕릉, 최영장군묘, 월산대군묘, 조선 제16대 인조의 파주 장릉(長陵), 파주 삼릉(고양 의 서삼릉과 구별), 율곡 이이 의 사당 자운서원 내 신사임당 과 같이 모신 가족묘 등, 또 세조의 비 정희왕후(파주 파평 윤씨)는 이 지역출신이다.
용암사 도로변에 내리니 장지산자락 겨울나무들은 가지 사이로 바람을 흘리고 있다. 사찰 입구 일주문 밖에서도 마애이불입상 이 보인다. 놀랍게도 얼마나 큰 지.. 그리고 그 형태와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이 이전 석불과 전혀 다르다. 남자 미륵불과 여자 미륵보살. 김정호 대동여지도에 '미륵'이라고 표시돼 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 용미리 '쌍미륵불'의 위용. 총높이 약 17m, 머리부분(어깨 위) 높이만 약 4m쯤 의 대형불상이다. 목,머리,이마,보개,장식의 5개 구성품을 따로 제작해 탑처럼 포개 놓았다. 안면부에 곰보같은 자국은 6.25때 총탄을 맞아서란다.
쌍미륵불 의 가장 큰 특징은 '남여를 형상화한 국내 유일의 병립 불상'이다. 즉, 남자 미륵불과 여자 미륵보살 또는 남편과 아내의 병립을 상징하고 있다. 또 비구승과 비구니승으로 볼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 견해지만, 현재 관리하는 사찰이 있다고해서 꼭 미륵불이 아니라, 토테미즘 적으로 본다면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불자 또는 먼 발치에서 뭔가를 두고 염원하는 부부(가시버시)의 외경스러움이다. 이같은 형상을 꼭 불교적 테두리 안에 넣을려는 것도 억지스러운 일이다. 우리보다 수 백년 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큰 바위 얼굴' 이미지 랄까?
여기는 개경과 남경을 오가는 주 도로이고 중국사신들도 이 통행길을 이용했었다. 그런데 혜음사신창기에는 천안 봉선홍경사 와 같은 목적으로 도적과 여정의 피로를 풀고 가기 위한 절과 여관 주막 등 을 갖춘 소위, 국립휴게소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쌍미륵불 설화는, 고려 선종 때 원신궁주가 이 쌍미륵불에 치성을 드려 왕자인 한산후(漢山候)가 탄생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는 마애명문이 있다. 오래전에 기록했었을 명문석들은 고의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보이고, 불상 왼쪽 특이하게 통바위의 중간만 갈라진 여성기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엔 근대에 덧기록했을 명문이 보인다. 우리들의 민간신앙이란 여근석 뿐만 아니라 또 남근석을 붙잡고 애원하여 소원성취한 것도 많다. 여기는 현재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찾는 이가 제법 있다고 한다. 신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진짜를 놓고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 중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이 미륵불에 이승만 대통령 모친도 아들을 낳기 위해 치성을 드렸다고 전해지며, 이대통령도 1953년 시찰, 1954년 10월 '미륵불 이대통령각하 기념탑 봉안식'도 했다(북한산 문수사 도 똑같은 일화가 전해지며 이 대통령도 방문했던 곳). 박정희 대통령도 1970년대 1군단 방문 후 유국준 외 참모들과 이곳을 방문, 참배해 국토통일 천일기도 광명등(光明燈)을 세웠다.
천천히 석불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보통 불상의 이미지 와는 다르게 힘있고 위엄있으며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다. 편한 느낌보다는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 신비감, 또 소박하면서 무표정의 투박함, 무뚝둑함에서 아득한 시간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칠레(령)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을 보는 느낌이랄까. (龍)
 |
| ▲ 연등을 달아 놓은 관계로 전체 모습을 찍기 힘들어 자료 사진을 빌린다. 아래 부분에 '世祖'라고 기록돼 세조와 정희왕후 를 모델로 제작했다는 설도 있는 용미리 마애불입상 ⓒ자료 |
 |
| ▲ 하단 '世祖'. 자료출처: 네이버블로그 '설고운' [http://blog.naver.com/hospitalx/90110109812]참고 |
▲ 고려 때 조성되었다는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이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누구의 모습도 본 적이 없다. 기도하다 그대로 시간이 멈춘 - 그대로 굳은 듯한. ⓒ20150228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연등을 달아 놓은 관계로 전체 모습을 찍기 힘들어 자료 사진을 빌린다. 아래 부분에 '世祖'라고 기록돼 세조와 정희왕후 를 모델로 제작했다는 설도 있는 용미리 마애불입상 ⓒ자료
▲ 하단 '世祖'. 자료출처: 네이버블로그 '설고운' [http://blog.naver.com/hospitalx/90110109812]참고
▼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방문 기념 ⓒ서울포스트
▼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방문기념 '광명등' ⓒ서울포스트
▼ 여성상징 주변으로 뭔가가 새겨진 마애명문 ⓒ서울포스트
 |
| ▲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방문 기념 ⓒ서울포스트 |
 |
| ▲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방문기념 '광명등' ⓒ서울포스트 |
 |
| ▲ 여성상징적 특이한 통바위 주변으로 뭔가가 새겨진 마애명문 ⓒ서울포스트 |
 |
 |
 |
 |
※ 참고한 자료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立像)]
보물 제93호
대한민국의 보물 (시기: 고려시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9
거대한 천연 암벽에 2구의 불상을 우람하게 새겼는데, 머리 위에는 돌갓을 얹어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까닭에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든다. 이런 점에서 불성(佛性)보다는 세속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방화된 불상이다. 왼쪽의 둥근 갓을 쓴 원립불(圓笠佛)은 목이 원통형이고 두손은 가슴앞에서 연꽃을 쥐고 있다. 오른쪽의 4각형 갓을 쓴 방립불(方笠佛)은 합장한 손모양이 다를 뿐 신체조각은 왼쪽 불상과 같다.
지방민의 구전에 의하면, 둥근 갓의 불상은 남상(男像), 모난 갓의 불상은 여상(女像)이라 한다. 고려 선종이 자식이 없어 원신궁주(元信宮主)까지 맞이했지만, 여전히 왕자가 없었다. 이것을 못내 걱정하던 궁주가 어느날 꿈을 꾸었는데, 두 도승(道僧)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長芝山)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 틈에 사는 사람들이다. 매우 시장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꿈을 깬 궁주가 하도 이상하여 왕께 아뢰었더니 왕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어 알아 오게 하였는데,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왕은 즉시 이 바위에다 두 도승을 새기게 하여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는데, 그 해에 왕자인 한산후(漢山候)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 불상들은 고려시대의 조각으로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탄생설화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된다.
※ 용미리 용암사(龍岩巖寺)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長芝山)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이다. 이 절의 창건은 절 뒤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있는 보물 제93호인 파주용미리석불입상(雙石佛)과 관계가 깊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선종이 왕후와 후궁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하루는 후궁인 원신공주(元信公主)의 꿈에 두 도승(道僧)이 나타나서 “파주군 장지산에 산다. 식량이 떨어져 곤란하니 그곳에 있는 두 바위에 불상을 조각하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였다. 기이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알아보니 꿈속에서 말한 대로 바위 두개가 서 있었으므로, 서둘러 불상을 조성하였다. 그 때 두 도승이 다시 공사장에 나타나서 좌측은 미륵불로 우측은 미륵보살상으로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모든 중생이 와서 공양하고 기도하면 아이를 원하는 자는 득남하고 병이 있는 자는 쾌차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그 뒤 불상이 완성되고 그 밑에 절을 창건하자, 원신공주에게 태기가 있어 한산후물(漢山侯勿)을 낳았다고 한다. 특히, 이 불상은 예로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들이 공양을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면 영험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아기를 원하는 부녀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36년 옛 절터 위에 새롭게 중창하였으며, 1979년에 대웅전을 지었다. 1984년에는 종각을 짓고 범종을 봉안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존 당우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웅전과 미륵전, 요사채 등이 있으며, 최근에 환경을 정화하였다. 또한, 쌍석불 옆에 있는 동자불상과 칠층석탑은 이승만대통령이 1953년에 쌍석불을 참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한 것으로 1987년 철거하여 대웅전 옆에 두었다.
※ 사진: 자유당 때 용미리 석불 사진-인터넷
왼쪽 미륵 어깨 위에 아기 부처가 있다.
 |
| ⓒ자료 |
인터넷에 아마추어 문화애호가 박상표 씨가 쓴 글이 있다.
제목은 “아기부처 가족과 헤어진 기구한 사연’ 인데, 워낙 이 사람 저 사람 퍼 나른 통에 원래 올라 온 사이트를 잘 못 찾겠다. 하여튼 원본 여부에 관계 없이 인터넷 검색창에 ‘용미리 석불, 박상표’ 를 치면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 박사는 1953년 10월 11일 용미리 석불을 시찰하며 개수(改修)와 아기부처(동자불)를 추가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파주군수 등은 지시를 따르면서 석조 7층 이대통령 기념탑까지 건립한다. 1954년 10월 28일 이 대통령과 함태영 부통령을 비롯, 이기붕 국회의장, 내무장관, 문교장관, 경기지사, 파주군수에 미국대사 부부, 미 제1사단장까지 참석하여 ‘미륵불 이대통령각하 기념탑 봉안식’ 을 거행하기에 이른다.
※ 용미리 석불 조성 연대에 관한 학설
경기도 파주 장지산 솔밭 가운데에 우뚝 서서 서울과 개성을 잇는 길목을 지켰던 ‘파주 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이하 용미리석불)’은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초 조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m가 넘는 큰 규모와 특이한 형상이, 지방화 돼 다양하게 나타났던 고려시대 석불(또는 마애불)의 특징과 부합하는데다 조성과 관련된 전설의 배경이 11세기여서 고려시대조성설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5·16일 통도사에서 열린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경화 조선대 강사가 조선초조성설을 제기하면서 용미리석불의 조성연대에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경화씨는 조선초조성설의 근거를 용미리석불 측면 바위와 불신 하단에 있는 명문(銘文), 원정모를 닮은 보개(寶蓋) 등에서 찾고 있다. 조성연대와 기원문, 시주 및 화주 이름이 적혀 있는 명문에 따르면 용미리석불은 세조의 왕생정토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며, 그 연대는 성화(成化·明현종) 7년(1471년·성종2년)이다. 양녕대군의 아들 함양군(咸陽君, 1416~1474)과 한명회 셋째 부인으로 추정되는 정경부인 이씨 등이 시주로, 왕실과 밀착된 승려 혜심(惠心)이 화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경화씨가 이 명문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이는 박홍국씨로, 1995년에 소개하면서 조성연대를 성화 1년(1465년)으로 읽었고,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조상명으로서의 타당성은 논증되지 않은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후 기존의 설은 유지됐고, 명문은 불상과 별개의 것 또는 후대에 새겨진 것으로 간주돼왔다. 이경화씨는 그 명문을 다시 연구하고, 근거를 확보해 1471년 조성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박씨의 1465년과 6년의 차이가 생긴 까닭은 박씨가 연대부분을 ‘성화 一년’으로 읽은 데 반해 이씨는 ‘성화 七년’으로 읽었기 때문이다.명문이 용미리석불을 중수하고 새겨진 것이라거나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씨는 용미리석불이 세워진 파주가 세조의 비(妃)인 정희왕후의 고향이며, 예종·성종의 비로서 요절했던 한명회의 두 딸의 무덤(공릉·순릉)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시주로 참여한 이들은 세조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예종·성종 비의 능이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대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당시 권세와 재력을 겸비한 이들이 기존의 석불을 중수하기보다는 새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명문이 용미리석불 조상과 함께 새겨진 것이라고 보는 또 하나의 유력한 근거는 원정모(圓頂帽) 형태의 보개다. 원정모는 원나라 귀족들이 쓰던 모자로, 고려말·조선초에만 관리와 승려가 많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미리석불의 원형 보개가 원정모가 맞다면 11세기에 조상됐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1144년에 김부식이 찬한 ‘혜음사신창기’ 또한 이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기록은 용미리석불 인근에 위치해있는 혜음사에 대한 기록인데, 대불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절뿐 아니라 숙박기관, 행궁의 기능까지도 겸한 혜음사를 설명하면서, 이정표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했을 용미리석불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는 것은 당시에 지금의 용미리석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경화 씨의 조선초조성설에 대해 학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이씨의 연구에 대해 “원형 보개를 원정모라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얼굴이나 신체에 관한 도상연구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명문에 열거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중수기에 이름을 적어 넣었을 가능성은 적다”며 조선초조성설을 지지했다. 반면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용미리석불이 조선시대 조성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상 전면에 명문을 새기는 법은 없는데, 용미리석불의 명문은 전면에 있어 조상당시 새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문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용미리석불은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조성할 수 있는 대불이다”며 “만약 조선시대 세워졌다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조선실록에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며 조선초조성설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포털
다음 에 뉴스 송고)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중국여행사진] 중국 허난성(하난성 하이난성 하남성 河南省)에 위치한 노군산(老君山)](/paper/data/news/images/2015/03/1_S_1425654759.jpg)
![[포토] 달맞이 - 철마산 능선으로 뜨는 정월대보름달](/paper/data/news/images/2015/03/1_S_1425624363.jpg)
![[탐방]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용암사 '마애이불입상'](/paper/data/news/images/2015/03/1_S_1425213528.jpg)
![[전시] 광주롯데갤러리, 화양연화 花樣年畵 展](/paper/data/news/images/2015/02/650_S_1425085604.jpg)
![[포토] 봄이 오는 소리](/paper/data/news/images/2015/02/650_S_142508556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