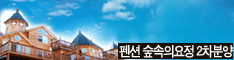[탐방] 충북 진천 - 김유신 탄생지, 길상사, 농다리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불완전하지만 반도 내 삼국을 1차로 통일한 신라의 주역 김유신이 충청북도 진천 태생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드문 것 같다. 그의 묘가 경상도 경주에 있으니 대부분 사람은 출생도 그 지방으로 어디쯤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
| ▲ 길상사 흥무전에서 내려 보이는 전경 ⓒ서울포스트 |
 |
| ▲ 진천군 안내표지 ⓒ서울포스트 |
황금빛으로 물든 진천의 10월 들판에서 왜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이라는 말이 나왔는가를 생각하며 고속도로표지판으로 보았던 '농다리'를 건너보고 싶어졌다. 농다리 입구에 세워진 진천군 안내판에는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도 표시돼 있다.
(※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 옛날에 효심이 지극한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용인에,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진천에 살았다. 어머니를 서로 모시고자 형이 진천 원님을 찾아가 탄원했는데, 효심이 지극한 형제를 보고 원님이 판단해 주기를 "살아서 모시는 것과 죽어 모시는 것이 같으니, 어머니가 살아 계실때는 동생이 지극으로 진천에서 모시고, 돌아가시면 용인에 묘를 써서 형이 제사로 모시도록 하라."라는 말에서 유래된다 함.)
충청북도 진천군에는 문백면 구곡리의 진천 농교(鎭川籠橋 농다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 진천읍 산척리의 이상설생가(충청북도 기념물 제77호), 초평면 용정리의 이시발신도비(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2호)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또한 진천읍에 있는 길상산吉祥山(461.8m, 고려때 태령산胎靈山으로 불림)은 김유신의 태(胎)를 묻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한 길상사(吉祥祠:충청북도 기념물 제1호)가 있다.
 |
| ⓒ자료사진 |
살아서는 최고의 권력까지 오르고 죽어서 비로소 왕이 된 김유신. 신라에 귀화한 가야왕족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신라정권의 중추적 인물로 성장한 것은, 증조부가 나라를 들어 신라에 부항(俯項)한 다음에도 당시 가야국 복원운동은 꾸준히 있어 이에 신라는 전쟁에 용감한 가야군을 써서 왕실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서쪽 백제(삼국초기 가야는 백제에 통합됨)를 적절히 견제하는데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誕生址 및 胎室): 사적 제414호(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8번지 외 129필지)
김유신이 태어난 곳은 만노군 태수로 부임한 아버지 김서현 장군이 집무를 보던 곳. 김유신 장군의 태실은 탄생지 뒷산 태령산성의 정상부에 있으며 자연석을 둥글게 기단으로 쌓고 주위에 돌담을 쌓아 신령스런 구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으로 3단의 석축을 쌓은 뒤, 그 위에 흙을 덮은 봉분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고대 신라의 산성 축조술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보정이라는 우물은 생가터 가까운 곳 화랑정 활터 왼쪽 산기슭으로 오르면 있다.
 |
| ▲ 김유신 탄생지 ⓒ서울포스트 |
 |
| ⓒ자료사진 |
 |
| ▲ 윤허비 와 탄생지 안내문 ⓒ자료사진 |
 |
| ▲ 길상산(태령산) 정상에 있는 태실 ⓒ자료사진 |
 |
| ▲ 연보정 ⓒ자료사진 |
길상사(吉祥祠):) 충북기념물 제1호(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08번지 일대. 김유신 장군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
길상사는 1975년 2월 21일 충청북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김유신(金庾信:595~673)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원래 길상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신라시대부터 김유신의 태(胎)가 묻힌 태령산 아래 사당을 건립하고 나라에서 제를 지내오다가 1399년(태종 8)부터 관행제(官行祭)로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
| ▲ 길상사 ⓒ서울포스트 |
 |
| ▲ 길상사 안내문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자료사진 |
 |
| ⓒ자료사진 |
 |
| ⓒ서울포스트 |
그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당이 소실되자 1851년(철종 2)에 정재경, 박명순(朴命淳) 등이 백곡면 가죽리에 죽계사(竹溪祠)라는 이름으로 사당을 재건하여 조감과 함께 장군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죽계사가 철거된 이후 진천읍 벽암리 소흘산(所訖山) 아래 서발한(舒發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당을 짓고 계속 제향하였으나 1922년 홍수로 유실되었다.
1926년에 후손인 김만희(金萬熙)의 주선으로 현재의 위치인 벽암리 도당산성(都堂山城) 안에 길상사를 건립하였다. 6·25전쟁 때 심하게 파손되어 중수하였고 1976년 사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면 신축되어 현재에 이른다.
진천 농교(鎭川籠橋 농다리): 충북유형문화재 제28호(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601-32번지)
 |
| ▲ 진천농교(농다리)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
| ⓒ서울포스트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고려 때 축조되었다고 전해지는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8호의 돌다리로 100m가 넘는 길이였다고 하나 지금은 길이 93.6m, 너비 3.6m, 두께 1.2m, 교각 사이의 폭 80㎝ 정도이며 '농다리'라고도 하는데, 작은 낙석으로 다리를 쌓은 방법이나 다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축조한 기술이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다리에 속한다.
현재 24개만 남아 있는 교각은 당초 하늘의 기본 별자리인 28숙(宿)을 응용했고 장마 때면 물을 거스르지 않고 다리 위로 물이 넘어가게 만든 수월교(한강의 잠수교같은)다. 교각부터 상판석까지 다리 전체는 사력암질의 붉은색 돌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는 자석배음양, 즉 음양의 기운을 고루 갖춘 돌이라는 고서의 기록에 따른 것.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리 일부가 소실된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당시 5칸이 떨어져 나갔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고시에도 3칸이 떨어졌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 지역의 빼어난 경치를 한데 묶어 '상산팔경(常山八景)'이라 부른다. 농다리 위에 눈이 쌓일 때 모습을 일컫는 '농암모설(籠巖暮雪)'도 그중 하나.
 |
| ⓒ서울포스트 |
소습천(消濕泉)
 |
| ▲ 소습천 ⓒ서울포스트 |
 |
| ⓒ자료사진 |
그 옛날 안질을 앓던 세종대왕이 초정리로 향하던 중 마셨다는 소습천은 굴티마을의 '품(品)'자형 바위틈에서 솟아난다. 안질, 풍, 피부병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임금이 마셨다고 해서 '어수천(御水泉) 약수'로 불린다. 이 샘물은 풍습에 좋고 안질에도 양약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말이 널리 알려지자 인근 지역 아낙네들은 치마로 병풍을 만들어 치고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
가을 - 충청도
한 2주 충청북도를 오가거나 머물렀다.
가을이 막 여물기 시작할 때 발을 딛어,
일을 마무리하고 아쉽게 돌아올 때는 오곡이 터져가는 즈음이었다.
푸른 들녘이더니 10여 일 새 햇빛은 노란 볏짚으로 바짝 달군다.
충절의 고장이자 맑고 푸르른 산야의 충청.
맑을 淸 자가 유난히 많은 지역에서 가을 햇살 담은 추억은 또 오래 기억될 일.
1년이 지났는데도 3년 상을 치른다며 여전히 상복을 입고 계시는 유림도 뵈었고,
중부의 끝없는 벌판과 깨끗한 도농에서의 낮들은 하는 일과는 무관하게 부드럽기만 했다.
지금 가을 들판은 비우기에 분주하다.
비운다는 것은 새로운 채움을 약속하는 것.
그래서 비움이 결코 상실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내어 놓지 않으면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가을 나를 비워 놓자, 그리고 나를 내어 놓자.
[수집·정리·편집] =
(양기용 기자)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김유신에 대한 요약]
김유신의 본관은 김해. 가야국 김수로왕의 13대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532년(법흥왕 19)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의 구해왕(仇亥王)이며 아버지는 대량주도독(大梁州都督)를 지낸 서현(舒玄)이다. 어머니는 지증왕의 증손녀이자 갈문왕 입종(立宗)의 손녀인 숙흘종(肅訖宗)의 딸 만명(萬明)이다. 동생은 흠순(장군)과 누이동생 보희, 문희(문명왕후文明王后: 김춘추와 혼인-문무왕과 김인문 낳음)다.
595년(진평왕 17)-673년(문무왕 13)을 산 김유신은 만로군(진천의 옛이름) - 현재 진천읍 상계리 계양마을에서 태수 김서현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 609년(진평왕 31) 15세 되던 해 화랑이 되어 낭도를 이끌고 수련했다.
629년(진평왕 51) 8월 이찬(伊湌) 임영리(任永里) 등이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할 때 중당(中幢)의 당주(幢主)로서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움.
642년(선덕여왕 11) 압량주(押梁州;지금의 경북 경산시) 군주(軍主)가 되었고, 644년 소판 벼슬에 올랐다. 같은 해 9월 상장군(上將軍)이 됨.
647년(선덕여왕 16, 진덕여왕 1) 1월에는 여왕을 폐하려고 난을 일으킨 상대등(上大等)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의 반군을 토벌.
660년(태종무열왕 7) 1월 상대등에 올랐고, 7월 신라 정예군 5만과 소정방(蘇定方)이 이끈 당나라군 13만이 연합하여 사비성(泗沘城)을 함락시켜 백제를 멸망시킴.
668년(문무왕 8) 고구려를 정벌한 후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는 데 힘써 태대각간(太大角干)이라는 최고직위에 오름.
673년(문무왕 13) 7월 병으로 세상을 떠남. 유해는 금산원(金山原;지금의 경북 경주시)에 장사지냈고, 835년(흥덕왕 10)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존됨. (이상)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탐방] 충북 괴산 - 선유동 계곡과 박온섭 선생](/paper/data/news/images/2009/10/1_S_1261072657.bmp)
![[탐방] 충북 진천 - 김유신 탄생지, 길상사, 농다리](/paper/data/news/images/2009/10/1_S_1260154850.jpg)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화려한 개막](/paper/data/news/images/2009/10/1_S_1255803457.jpg)
![[남미여행기] 노트북 도난사건](/paper/data/news/images/2009/10/12_S_1255802214.jpg)